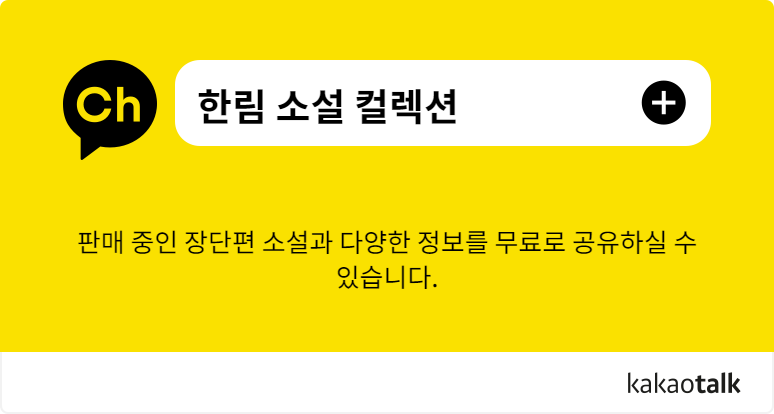조선 500년 이슈 1_ 하여가何如歌와 단심가丹心歌(2-2)
나라와 백성을 위해 끊임없이 이어지는 태종의 정치역정

1367년 조선 태조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로 태어난 이방원李芳遠, 자는 유덕遺德이고 호가 방원芳遠이다. 맏형인 정종의 양위를 받아 3대 조선 왕으로 즉위하니 그가 4대 세종대왕의 아버지 태종이다.
개국 조선의 부흥에 특히 심혈을 기울인 태종은 그때까지 공신들이 사적으로 소유・관리하던 사병私兵제도를 폐지한다. 혁명으로 나라를 바꾼 이였으니 역시 다른 이들의 혁명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을 터.
군대의 위력을 일찌감치 인식한 바 있는 그는 반대론이 없지 않았지만, 강권으로 사병을 나라의 군대로 편입시켜 국방력을 강화하였다.
1404년에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고 의정부를 설치하였으며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의 6부를 직접 관리함으로써 국정에 대한 왕의 권한 또한 크게 높였다.
또한 숭유억불崇儒抑佛 정책으로 수많은 사찰을 폐쇄하고 도참사상을 엄히 금지해 미신 타파에 힘썼다. 반면 유학을 널리 장려하고 과거제도를 정착시켰으며, 성균관과 5부 학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했다. 호패법을 시행하여 신분 질서를 명확히 정착시킴과 동시에 국력의 근원인 인적자원을 제대로 파악하고자 힘썼다.
또 태종은 하륜 등을 시켜 ‘동국사략’과 ‘고려사’ 등을 편찬케 하였다. 경제적으로 호포戶布를 폐지하여 백성의 부담을 덜어 주었고 신문고도 설치해 백성의 민원에 귀를 기울이려 애썼다.
아버지 이성계보다 훨씬 더 강성으로 새 왕조의 부흥을 모색하는 데 최고의 힘을 보탠 그였다. 이처럼 문무를 겸비한 이방원의 정치철학과 정몽주의 지성이 합해졌더라면 초기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지는 않았을까.
혹여 하는 아쉬움과 함께 당시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을 곱씹어본다.
“임금의 명은 물불을 피할 수 없다.”

정몽주의 본관은 영일迎日, 자는 달가達可이며 호는 포은圃隱이다. 그의 선조 중에 의종 때 임금의 잘못을 직간했다가 간신들의 비방으로 자결한 정습명이 있다. 어렴풋이나마 포은 가문의 내력을 헤아리게끔 하는 대목이다.
포은. 그의 호에서 은사隱士들의 은둔사상과 내재한 철학을 환기하게 된다. 잠시 몸은 피할지언정 뜻마저 굽히지는 않는다고 했던가. 포은은 삼봉 정도전과 함께 당대의 대학자 목은 이색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고려 공민왕 9년(1360)에 장원급제한 포은은 예문관 검열, 예부 정랑, 대사성 등 여러 벼슬에 올라 많은 일을 했다. 의창을 세워 빈민 구제에 심혈을 기울였는가 하면 유학을 보급했으며, 5부 학당(개성)과 향교(지방)를 세워 교육 진흥에도 적지 않은 업적을 남겼다. 또한 이성계가 여진족을 토벌할 당시에는 그의 종사관으로 종군한 바 있다.
포은은 뛰어난 외교가인 동시에 탁월한 시인이었다. 외교상 명나라나 일본을 다닐 때도 그는 시와 함께했다.
포은은 공민왕 때 한 번, 우왕 때 세 번 명나라를 네 차례나 왕래했다. 사신 또는 외교사절의 신분으로 90일은 족히 걸리는 먼 길을 오갔다.
세 번째 방문은 명나라와의 관계가 지극히 불편하여 신분의 위협마저 느껴 어떤 이유로든 고사했을 법도 한데 임금의 명인지라 더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한다.
결국 포은은 명나라로부터 세공歲貢 면제를 끌어내는 등 고려의 입지를 다지고 국익을 높이는 외교능력을 발휘했으며, 틈틈이 했던 시작詩作도 상당히 많다고 한다.
당시 포은의 시에서 정도전은 다양한 주제와 작품의 뛰어남을 평가했다. 대사성 이색은 제자인 포은을 높이 여겨 ‘동방 이학理學의 시조’라 칭하였다. 학자로서 포은의 위상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대목이다.
훗날 조선 때 중국에서 들어온 다른 유교 경전과 정몽주의 강의내용을 비교할 때 틀린 곳이 없어 정몽주를 동방 성리학의 실질적인 창시자 또는 성리학의 시조로 여긴다. 거기 더해 이색은 포은이 문화교류의 일면까지 살필 수 있는 시사詩史의 역할을 함에 부족함이 없다고 칭송했다.
일본에 갔을 때도 포은의 시가 커다란 힘을 발휘한 일화는 아직도 널리 전해진다. 포은은 자신의 시에 감복한 규슈九州 최고 관리에게 왜구의 단속을 청하여 승낙을 얻어냈고 잡혀간 고려인 수백 명을 데려올 수 있었는데, 이 일화는 포은의 외교적 능력과 함께 그의 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암시하는 일례가 아닐 수 없다.
포은은 풍류 또한 무척 즐긴 듯하다.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은 포은을 가리켜 풍류가 호탕하고 문장도 호방 걸출하다고 평가했다.
‘포은집圃隱集’에는 총 252제 315수의 한시가 전해지고 있어 그의 시적 높이와 넓이를 가늠하게 한다. 거듭 되새겨도 정몽주는 고금을 막론한 위인이자 특히 시대의 본보기로 떠올릴만한 큰 인물이 아닐 수 없다.
새로 일어나는 명나라의 세勢를 가늠하고 신속히 대처한 국제적 외교 역량은 왜 지금에 와서 더욱 절실한 것일까.
독도의 소유권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요즘에 그의 외교적 역량, 그의 걸출한 지성이 절실하고 갈급한 건 극빈한 인물난, 작은 정치, 거기에 식상하고 환멸을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란 생각이 든다.
휘돌아 둘러보는 충절 지공의 삶과 죽음

경북이 고향인 정몽주의 묘소는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에 있다. 왜일까. 포은을 잡아끄는 용인의 지력地力이 엄청나게 강해서는 아닐까.
개성 선죽교에서 생을 마감하고 풍덕에 수습한 포은의 묘를 이장하는데 명정銘旌이 용인까지 날아가더니 지금의 묏자리에 떨어졌다고 한다.
정몽주라는 큰 별을 모신 능원리, 그의 사후 거처 앞에는 단심가와 포은의 어머니가 지었다는 시조의 비가 나란히 서 있으니.
까마귀 싸우는 골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 흰빛을 새오나니
청강에 고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흑백을 선명하게 가르는 섬뜩함, 아들에게 이르는 어머니의 가르침 역시 서슬이 느껴질 정도로 그날이 너무나 날카롭다.
구차하게 세상에 동화하느니 학자와 정치인으로서의 소신을 지켜 깨끗한 죽음을 맞는 게 길임을 가르치는 어머니의 심정을 곱씹노라면 또 한 번 가슴이 저려온다.
생존 시의 위대함이 죽음으로 더욱 빛을 발한 것일까. 위화도 회군 후 군정을 장악한 이성계를 조준, 남은, 정도전 등이 새 임금으로 추대하며 시류에 영합할 때 정몽주는 그 역성혁명의 반대편에서 꼿꼿한 몸을 세운다.
1392년 4월 4일, 정몽주는 이방원에 의해 죽음을 맞지만 죽인 이, 즉 태종은 즉위 1년 만에 포은을 영의정에 추증하고 익양부원군에 추증한다.
그 후 중종 때 문묘에 배향되면서 개성의 숭양서원 등 11개 서원에 제향 되는바, 이로써 이성계의 조선 창건에 회유되지 않고 저무는 고려에 충절을 바친 정몽주는 세상의 영원한 이름으로 거듭난 것이다.
역사상 두 왕조를 섬길 수 없다며 산간으로 피한 은사도 적지 않았고, 그러한 충의와 절개가 동양사상의 질을 높여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후를 알면서, 그 최후가 살아서의 부귀와 얼마나 극명하게 다를 것인지를 익히 알면서 맞이한 포은의 최후이기에 훗날까지 그의 죽음은 진정한 충과 절의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다.
거기에 단심가와 선죽교가 극적인 감각을 더 얹으니 이기가 충만한 시대, 변절투성이 세상에 깊이 들여다볼 거울이자 곧추 새길 교훈으로 남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http://pf.kakao.com/_uLNKb
한림 글창고
삶의 의미와 메시지가 담긴 적은 글을 저장한 창고입니다.
pf.kakao.com
"제 카카오 뷰 채널(한림 글창고)입니다.
링크 주소 눌러서 채널 추가하시고 모든 정보와 글들을 마음껏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bookk.co.kr/search?keyword=%EC%9E%A5%EC%88%9C%EC%98%81
온라인출판플랫폼 :: 부크크
온라인출판플랫폼, 온라인서점, 책만들기, 에세이, 자서전,무료 출판
www.bookk.co.kr
http://pf.kakao.com/_DpNKb